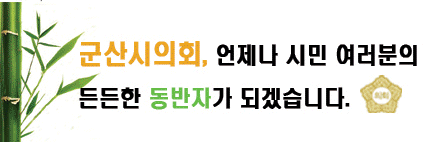[한국방송/이두환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게임중독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쪽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회 B위원회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됐고,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는 게임 이용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WHO의 결정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이유인데, 특히 의학계가 찬성 쪽에 서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선 ‘중독’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중독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상에 문제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신의학계 관계자는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는 것이 유해하다는 게 아니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 치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질병코드 등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으로 인정한다면 건강 측면에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하나의 근거다. 그간 관련 병명이 없어서 비슷한 병명으로 대신하거나 비보험으로 비싼 값에 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 발생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근거는 특정 범죄의 동기를 게임중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 부족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댄다. 사실상 문화·예술 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의견은 게임업계와 문화예술계가 내고 있다.
게임 관련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WHO 결정 직후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위축도 반대 측이 제시하는 근거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12월 셧다운제 시행 당시 게임업계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WHO의 결정 이후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의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WHO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도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WHO에 질병 등재를 요구에는 한국 측 의학계의 상당한 요청이 있었다는 후문도 나온다. 2014년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한 국회의원이 대한중독정신의학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